매거진R
임선영 작가의 오늘 뭐 먹지_들기름 내음 솔솔 퍼지는 청정 나물 밥상, 오대산 산채전문점
2021.01.25 | 조회 : 3,050 | 댓글 : 0 | 추천 : 0
임선영 작가의 오늘 뭐 먹지
들기름 내음 솔솔 퍼지는 청정 나물 밥상, 오대산 산채전문점

이 식당의 특별한 점을 꼽으라면 서울의 빌딩숲에 있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식당에 찾아와 허기와 목마름을 채우고 돌아갔다.
20여가지의 정성스런 밑반찬. 강원도 오대산 친환경 식재료.
30여년 한결 같은 주인의 손맛. 갓 지은 솥밥과 자박하게 끓인 된장 찌개. 원목 테이블에 묻어나는 토속적인 분위기. 서초구에 소재한 <오대산산채전문점>은 고요히 밥을 먹고 평화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식당 앞 너른 주차공간에 차를 대면서 오대산 일대인가 하는 착각이 시작되었다. 슬라이드 문을 열면 원목 산장 같은 내부가 보이는데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청정 산자락으로의 공간 이동이 시작된다.
살뜰하게 미소 짓는 여사장님은 이 공간에서 30년간 산채전문점을 운영하셨다. 벽면으로 보이는 유명인과의 사진이 그간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었다.
주방 상단에는 오대산에서 계절별로 공수해오는 산채의 사진이 보이고 들기름과 매실숙성액을 따로 판매한다는 문구도 보였다. 원목 탁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산채 정식을 주문했다. 정말 서울에서도 제대로 된 산채 정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의문을 지닌 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퍼져오는 솥밥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누그러뜨렸다.
“따뜻할 때 드세요” 이 말과 함께 반찬 7가지가 상에 올려졌다. 녹두전과 호박전, 감자전과 김치전, 두부부침과 황태조림, 그리고 도토리묵 무침. ‘그럼 그렇지’ 나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산채를 기대한 자신을 탓하며 일단 나온 반찬에 집중하기로 했다. 아담하고 정갈한 호박전과 녹두전은 금방 부쳐낸 따스함이 있고, 통감자를 갈아 만든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했다.
도토리묵 무침은 새콤 달콤 매콤한 양념장이 일품인데 몇 번을 집어 먹어도 입이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 졌다.
직접 담은 매실액이 양념장의 일등 공신이었다. 하나하나 맛보면서 만족감으로 빠져들어갈 즈음, 사장님이 웃으면서 다가오셨다. “이 반찬 그냥 북어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제대로 만든 황태예요. 황태조림 따뜻할 때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 이 집은 식재료 하나 허투로 쓰지 않으며 손님이 먹기 가장 알맞은 온도로 음식을 내온다는 것을.
그 때 즘 또 한번의 반찬을 담은 쟁반이 테이블을 찾아왔다. 순간 의심했던 마음을 두 손 모아 속죄했다. 6가지의 산채 나물과 버섯 2종, 2가지의 직접 담은 김치에 젓갈 한 종지와 잡채까지. 조기구이와 멸치조림도 함께 했다.
취나물, 민들레, 미역취, 가시오가피, 고사리, 도라지는 제각기 야생적인 향을 내뿜으며 상을 싱그러운 산내음으로 물들였다. 들기름으로만 슴슴하게 무쳐내고 보드럽게 씹히며 맑게 내려가니 가슴 속 묵은 때를 씻어 내리는 느낌이다.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은 쫀쫀하니 고소했고 잡채에도 품위가 느껴졌다. 직접 담은 석박지와 열무김치는 제대로 발효가 되어 소화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서 흑미와 콩, 은행을 올린 솥밥과 집된장으로 자박자박 애호박과 두부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가 나온다. 된장찌개 두 스푼을 넣고 나물을 넣어 쓱쓱 비벼 먹다가 입가심으로 솥밥 누룽지에 물을 부어 숭늉을 훌훌 마셨다.
산에서 맑은 정기를 흠뻑 마신 것처럼 든든하되 몸이 가벼워 지는 식사였다.


임선영 음식작가· ‘셰프의 맛집’ 저자 nalge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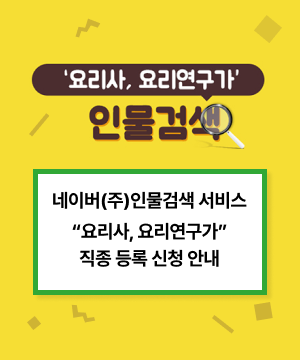
한줄 답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