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R
석박사의 오늘 뭐 먹지_기사문
2020.06.01 | 조회 : 3,156 | 댓글 : 0 | 추천 : 0
석박사의 오늘 뭐 먹지
파인다이닝 생선 횟집은 왜 없을까?

우리나라 횟집들은 천편일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륙에 있건 바닷가에 있건 가릴 것 없이 식당의 외관과 내관, 영업 방식 그리고 음식의 구성이 오십보백보라는 말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산소발생기가 달린 커다란 수조가 있고, 그 안엔 불안한 눈빛의 활어들이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데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사람에겐 인권, 동물에겐 동물권이 있다지만 생선은 동물이 아닌 모양이지요? 보신탕집의 끔찍했던 철창도 사라진지 오래인데 말입니다.
의자가 있는 식탁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손님을 맞는 상 위의 비닐 식탁보부터 대체로 저를 슬프게 합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치우기도 쉽고 행주로 닦지 않아서 좋겠지만 대접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소위 '스키다시'(곁들이 찬)의 향연이 시작되지요. 워낙 종류도 많고 양도 많아서 정작 주인공인 회 접시 놓일 자리가 없어 아직 손도 못 댄 안주들이 퇴출되기도 합니다.
생선회보다 더 많이 깔린 무채나 천사채가 또 한 번 우리를 슬프게 하고, 초고추장, 간장, 된장 그리고 싸구려 합성 와사비 등이 여기저기 묻으면 해산물 잔해들과 함께 식탁 위는 포화를 맞은 상흔처럼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숙성회를 잘 믿지 못하고, 씹는 질감을 중요시하는 성향 때문에 활어회 중심으로 많이 먹습니다. 소설가 한창훈의 표현을 빌리자면, 활어회는 의심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주인을 믿을 수 없어서 눈앞에서 잡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또 대략 여덟 시간 정도 지난 회 맛이 가장 좋은데 이를 '죽음의 시간이 주는 맛'이라고 하였지요.
결국 활어회보다 숙성회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는 말일 겁니다. 물론 생선의 종류에 따라 활어회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생선의 사후경직에서 오는 쫄깃한 식감을 추구하는 민족적 취향까지 존중한다면 왈가왈부 하는 것이 예의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생선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식재료여서, 횟감을 어찌 장만하고 보관하느냐, 칼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소스와 양념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맛은 다양하게 변합니다. 따라서 생선회 맛을 즐기려는 다채로운 시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최근 들어 한우고깃집도 일식당의 '오마카세' 형태나 양식당 서빙 방식을 차용한 파인다이닝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횟집(해산물 전문 식당)은 왜 파인다이닝이 안될까요? 그러한 질문에 '여기 있잖소!' 하고 외치는 곳이 서울도 아닌 동해안 강릉에 있습니다. 그간 소수의 식도락가들과 음식담당 기자들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알려졌지만, 이런 형태의 식당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강릉의 '기사문' 식당이 바로 그곳인데, 기사문은 강릉에 인접한 항구이기도 하여서 필요한 생선과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물 외관도 그렇고 예사롭지 않은 실내 장식과 집기 등에 일단 놀라는데, 파인다이닝답게 한상차림이 아니라 하나하나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고 첨가하는 양념 등도 횟감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라고 알려줍니다. 고급 양식당처럼 횟감의 종류나 곁들임 찬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빠지지 않아 감동 충만입니다.
기사문에는 특별히 정해진 메뉴가 없습니다.
그날 메뉴는 동해바다가 정해준다는 말도 들리고, 어부에 의해 선택된 놈들이 즐거워라 하면서 잡혀준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죽음의 시간이 주는 맛’을 즐기려면 예약은 당연할 겁니다.
기사문


강원 강릉시 정원로 78-22
033-646-9077
점심 코스 50,000원 저녁 코스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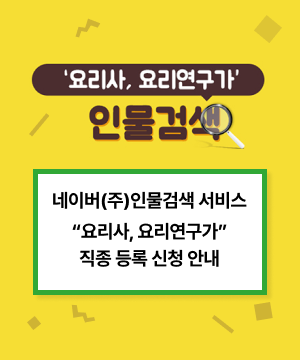
한줄 답변을 남겨주세요.